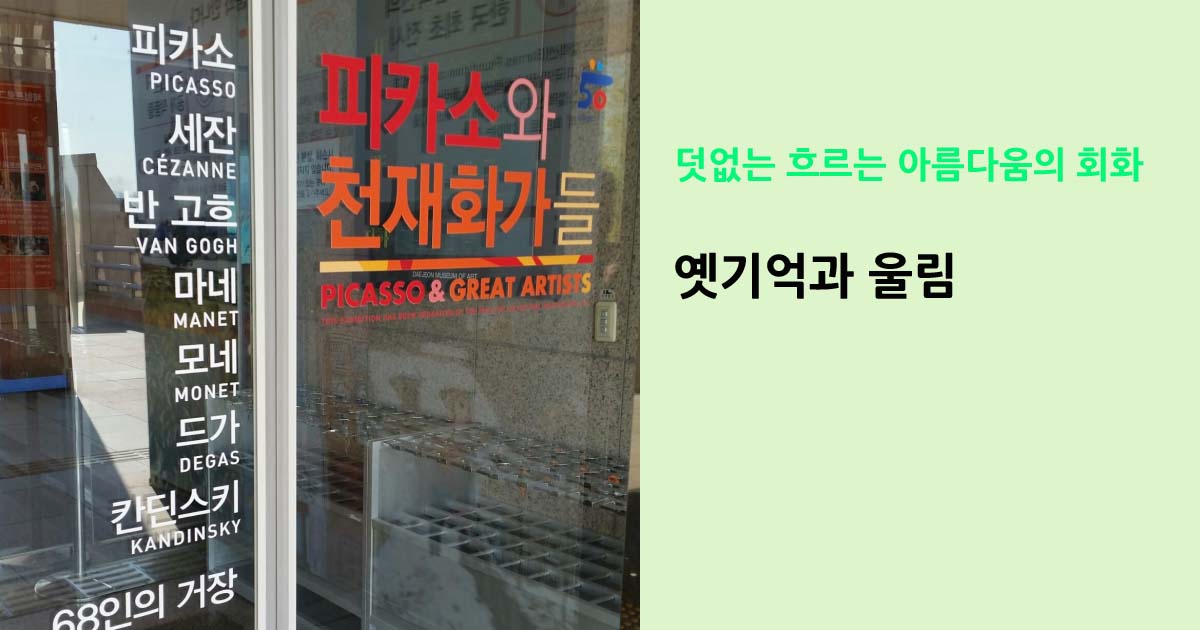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보니, 언젠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피카소와 천재화가들>에서 전시되었던 작품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전시회 제목으로는 피카소의 비중이 컸지만, 피카소는 나의 취향이 아니기에, 위트릴로와 모딜리아니 그리고 고흐에 포커스를 맞춰 사진을 감상했다.
그리고 폴 세잔의 ‘생 빅투리아 산’ 과 고흐의 ‘오베르의 집’ 작품을 보며 생각에 빠졌다. 문득 우끼요에(浮世絵)의 분위기에 젖은 것이다.
예술의 고독과 우끼요에
폴 세잔의 생 빅투리아 산과 우끼요에
폴 세잔의 ‘생 빅투리아 산’ 앞에서는 독일 영화 ‘사랑한 후에 남겨진 것들’의 우끼요에풍 후지산 풍경이 떠올랐다. 원근법과 입체감을 배제한 우끼요에(浮世絵)의 독특한 화풍은, ‘떠다니는 세상’, 즉 덧없는 삶을 상징하는 불교 용어이기도 하다.
세잔의 자신만만한 붓놀림과 견고한 형태 구축에도 불구하고, 그의 산은 어딘가 쓸쓸하고 덧없는 풍경으로 다가왔다. 마치 세잔 자신의 고독하고 굳건했던 삶의 여정이, 웅장한 산의 모습을 빌어 덧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잠겨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고집스러운 탐구와 자아 성찰은 영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시간의 강물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존재임을, 이 그림은 은근히 암시하는 듯하다.
오베르의 집 밀밭과 고흐의 삶
고흐의 ‘오베르의 집’ 밀밭에서는 천상의 영령이 머무르는 듯한 신성함이 느껴졌다.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담은 이 그림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고흐의 복잡한 심경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의 격렬한 붓질은, 마치 격정적인 그의 삶과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전달했다.

드가의 여성들과 마초적인 이중성
드가의 그림 속 아름다운 여성들은, 그의 마초적인 면모와 독신주의라는 이중성 속에서 더욱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 아름다움은 찬란하지만, 동시에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마치 삶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한 그의 그림은, 예술가의 복잡다단한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문과 같았다.
모딜리아니의 가을과 우수
가을빛 감성을 물씬 풍기는 모딜리아니의 그림은, 항상 나를 우수에 젖게 한다. 그의 그림 속 슬픔과 고독은, 박인환, 장 콕토,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예술가들의 삶과 기막히게 공명한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예술은 모두 덧없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이자, 깊은 고독의 표상이 아니었을까.
위트릴로의 쓸쓸함과 평안
위트릴로의 그림 두 점은,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쓸쓸함 속에 깃든 평안을 선사했다.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아름다움은, 마치 내면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듯한 평화로운 마음을 선사한다.

피카소의 ‘투우’와 중광스님의 ‘닭’
피카소의 격정적인 ‘투우’를 마주하며 나는 먼 기억 속, 중광 스님의 그림을 떠올렸다. LA 랭카스터 교수가 일컬었던 ‘한국의 피카소’라는 수식어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광 스님의 닭 그림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선과 역동적인 움직임은 피카소의 투우가 가진 격렬한 에너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피카소, 그 천재적인 재능 뒤에 감춰진 불안과 격정, 그리고 끝없는 실험 정신은 마치 투우의 맹렬한 움직임처럼 캔버스를 뚫고 나오는 듯하다. 스님의 붓끝에서 탄생한 닭과 피카소의 투우, 상반된 듯 보이는 이 두 세계는, 결국 예술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원초적인 힘의 발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예술과 삶의 메타포
이 모든 그림들은, 내 삶의 일탈을 대신하는 메타포이자, 나를 위로하는 뮤즈이다.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 그 숭고하고 덧없는 아름다움은, 결국 나를 더욱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다. 다만, 그 매혹적인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겠다. 그저~ 덧없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삶을 가져한다는 생각이다.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