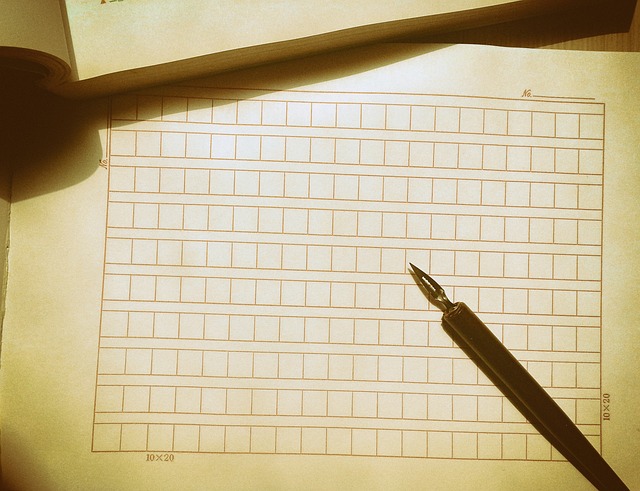댓글의 심리
글을 쓴다는 것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특정인에게 보낸 문자에 가타부타 답이 없을 때는 나도 불쾌하다. 그러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게시한 글에 댓글이 없을 때는 수돗물처럼 그냥 밋밋하게 마음을 흘린다. 허전함이 들기는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다. 이 실험을 적용하면 나의 경우는 자기애나 자존감이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겠다.
댓글도 품앗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SNS 초창기에는 나도 품앗이형 댓글을 달았지만 곧장 그만두었다. 영혼 없이 인사치레로 댓글을 쓰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였다. 작가의 모든 글이나 메모가 ‘좋아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나 노래에 경청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사람을 가끔 목격한다. 물론 경청의 에티켓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경청자의 교양에 해당되는 것이다. 경청자의 교양이 있고 없고에 본인이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혼 없고 진부한 대화를 경청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면 폭력이다.
나르시시즘의 글쓰기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르시시즘의 발로라고 한다. 간혹 자신의 일기마저도 타인이 봐주길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다. 하물며 심혈을 기울여 쓴 자신의 글에 반응이 없다면 왜 서운함이 안 들겠는가. 서운함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면 관종이 되기 십상이다. 인기를 먹고사는 셀럽에게 술과 마약등 약물 중독이 많은 것은 거품 낀 자기애나 자존감을 지녀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다양함의 사회라고 해도 보편적 다양성이 결여되면 고집이 될 수 있다. 이 고집이 때로는 철학이 되기도 하고 예술이 되기도 하지만 우선 당장은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은 뻔뻔한 저녁식사 딜레마나 죄수의 딜레마를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 배반의 결과가 나오기 쉽다. 따라서 믿음의 마음속에서도 배반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즉, 마음의 여유다. 문자가 없어도 댓글이 없어도 말이다.
마치며
▶여행이야기 바로가기 ☞
▶일상에세이 모음 바로가기 ☞
▶블로그의 일상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