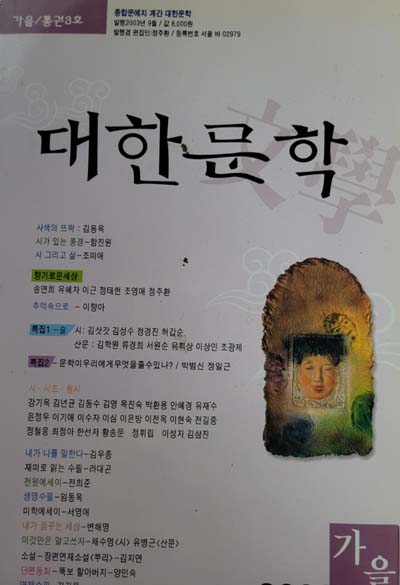나의 수필 등단기
나의 수필 등단기는 계간지 <대한문학> 가을/통권3호의 신인상 수필부문에 응모했던 지난 날의 이야기이다. 그때를 회고하며 다시 한번 수필의 묘미와 글 쓰는 즐거움을 음미해 본다.
등단의 순간
이른 아침, 전화벨이 울린다. 신인상 수필부문에 수상소감을 보내달라는 전화였다. 한 잔의 냉수를 들고서 베란다에 나가 심호흡을 크게 해 보았다. 등단의 관문을 지나 수필가가 되었다는 현실이 기쁨에 앞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文學, 내 젊은 날에 듣기만 하여도 얼마나 가슴 뛰고 흠모하였던 문학이었던가.
수필과의 만남: 어두운 터널의 미명
나의 20대 초반은 궁핍함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흐느적거리던 시절이었다. 그런 염세적인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줄기 미명(微明)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문학이었다.
처음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독서를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학이라는 문화 속에 나 자신의 운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기연민적인 허무 속에서 나 자신만이 나의 길을 재촉할 수 있다는 화두를 얻게 된 것이다. 결국, 내 자신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이 계기가 오늘의 수필과의 만남이었다.
습작 노트
이 기간에 씌어졌던 <내일을 향하여>라고 표제가 붙은 낡고 두꺼운 습작노트가 한 권 있다. 이 노트에는 내 나이 25살에 시작하여 4년여의 단상(斷想)이 산문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지금 당장 읽을 수가 없다.
내가 쓰는 글들이 밖으로 드러남을 감추기 위해 당시에 익힌 속기(速記)로 글을 썼는데 지금은 속기를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속기를 복습하면 해독 할 수 있겠지만 신변잡기의 잡문(雜文)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 당분간 해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이 들어 추억을 먹고 살아야 하는 먼 훗날의 숙제로 남겨두고 싶을 뿐이다.
고독과 글쓰기의 연관성
나에게 있어 문학이란 배가 고파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을까? 30살이 되던 해에 일본으로 직장을 옮기고부터 생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습작은 멈춰지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고독감을 잊기위해 문학을 핑계로 이기적인 글을 썼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었다. 이런 자학 속에서 한동안 문학은 내게서 그렇게 멀어져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갔지만 문학에 대한 흠모의 정은 버릴 수가 없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 마음 속에는 항시 가슴 시린 영혼의 허전함이 느껴졌었다. 결국, 문학은 나의 삶과 영혼의 일부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서른 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피천득) 이라는 수필을 마흔이 넘어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상의 지인들과 교류하며 서로 작품을 감상하기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공부를 겸하여 몇 권의 수필 이론서도 탐독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필이론을 알게 되자 오히려 글쓰기가 두려워졌다.
수필의 난제: 간결함과 진실
수필이란, 작가의 체험과 자기고백적인 글을 원고지 14매 내외의 짧은 글 속에 표현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학적 향취가 넘치는 간결한 글이어야 하고, 신선한 소재여야하고, 잔잔한 감동이 흐르는 진실한 글을 써야 한다고 한다.
시나 소설처럼 허구적인 연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가의 체험과 진실만으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쓴다는 건 나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급기야 습작을 다시 포기할까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썼지만 다음날 다시 읽어보면 나의 글은 수필이 아닌 잡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글 쓰는 데 왕도가 따로 있겠는가. 송나라 구양수가 말한 삼다(三多)인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게’ 최고라는 생각에 다시금 습작을 하게 되었다. 2년여의 습작기를 거치면서 관조와 통찰의 문학이라는 수필에 나 자신을 불태우고 싶다는 열정을 품게 되었다.
등단이란, ‘지금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잘 쓸 수 있는 기본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문’이라는 문단 선배들의 이야기에 용기와 희망을 갖고 수필부문에 응모를 하였던 것이다.
잘 쓴 수필과 좋은 수필
수필이론서(박재식)에는 ‘잘 쓴 수필’과 ‘좋은 수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잘 쓴 수필’이란 분석적인 음미를 통해 구성과 문장력이 뛰어난 글이고 ‘좋은 수필’이란 내용의 질에서 느끼게 되는 감동의 글이라고 한다. ‘잘 쓴 수필’이 ‘좋은 수필’이 될 확률이 크기는 하지만 반드시 ‘좋은 수필’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습작기 글들을 유심히 보면 ‘좋은 수필’ 보다는 ‘잘 쓴 수필’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썼던 경향이 짙다. ‘좋은 수필’은 ‘잘 쓴 수필’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기에 어느 한 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굳이 어느 한 편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는 ‘좋은 수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경수필의 매력
나는 앞으로 지적논리와 깊은 철학적인 내용의 중수필보다도 일상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경수필을 주로 쓸까한다. 좀 더 글의 표현력을 높이고, 폭넓은 독서로 제반지식을 넓히며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감상(感傷)을 배제하여 밝고 은은한 수필을 쓰고 싶다. 거기에 문학적 향취에 젖은 예술품으로서의 ‘수필’을 썼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본다.
향긋한 수필을 위하여
아내는 가끔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할 경우가 있다. 출근 길 자동차 안에서 아내는 언제나 종이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 이 때 차 안으로 소리 없이 젖어드는 은은한 커피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제 등단의 관문을 지난 나의 글들이, 이런 커피 향처럼 ‘부드럽고 은은함’이 배어나는 그런 수필이 되기를 다짐 해본다.
대한문학(가을/통권3호) 수필부분에 등단의 관문을 지나며……
마치며
▶여행이야기 바로가기 ☞
▶일상에세이 모음 바로가기 ☞
▶블로그의 일상 바로가기 ☞